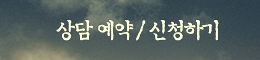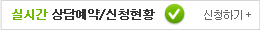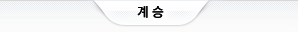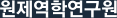흙산에선 돌을 찾아라
페이지 정보
본문
남자만으로 혹은 여자만으론 새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다. 천지만물의 운행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양기(陽氣)는 하늘의 기운이요, 땅의 기운은 음기(陰氣)다. 음기와 양기가 합쳐져야 생명체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풍수에선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어떠한 기(氣)를 받는가에 따라 그 발전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기에 묏자리나 집을 지을 때면 으레 ‘명당 찾아 삼천리’ 다.
또 다른 시각으로 자연과 인간도 음과 양의 조화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적(動的)인 인간을 양으로 본다면 정적(靜的)인 자연을 음으로 볼 수 있겠기에 말이다. 어찌됐건 결론은 인간과 자연은 한몸이 돼야 한다는 거다.
땅도 마찬가지다. 자연에선 돌을 양으로, 흙을 음으로 볼 수 있다. 돌과 흙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 져야 생기(生氣)가 도는 땅이 된다.
거창의 금원산(金猿山)자락엔 동계(桐溪) 정온(鄭蘊) 선생의 종택이 있다. 금원산은 거대한 바위산이다. 선생의 생가는 이 산의 맥(脈)이 몇 개의 기복(起伏)을 거쳐 자그마한 동산을 솟구치게 한 그 아래 길지(吉地)에 자리잡고 있다. 15세기에 활동하신 분이니 줄잡아 400년이 넘는 고택이다.
이 집은 금원산에서 수km는 족히 될 만한 거리에 위치한다. 기복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위의 센 기가 흙의 부드러운 기운에 융화된 뒤에 결혈(結穴)됐다고 보면 되겠다. 반면 청와대 터는 나쁘다고들 한다. 돌산인 북악(北岳)의 기가 미처 정화되기 전의 지점에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인간이 거주하기엔 그 기가 너무 세다는 의미가 된다.
흙산에선 돌이 혈(穴)의 주요 증거가 된다. 단단하게 박힌 돌은 산의 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자리는 일반적으로 주위보다 도톰하게 솟아오른다.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말이다. 땅의 정기가 뭉친 곳이다. 그 자리에 좌향(坐向)만 맞추고 시신을 안치하면 그만이다. 파내고 북돋울 필요가 없다. 큰 명당은 대부분 이러한 곳이다. 하지만 어지럽게 널려진 뜬돌은 예외다. 나쁜 땅이란 얘기다.
반면 돌산에서의 흙이 뭉친 곳은 일종의 괴혈(怪穴:일반적인 풍수이론으론 성립되지 않는 혈)로 볼 수 있다. 위험부담도 크지만 혈이 올바르다면 그 만큼 큰 자리다. 음택(陰宅)의 경우 염두에 둬야할 사안이다.
풍수 고전 ‘금낭경(金囊經)’ 에 이런 말이 있다. 대자특소, 소자특대(大者特小, 小者特大). 주위의 산이 웅장하다면 작은 곳에 혈처(穴處)가 있고, 주위가 빈약하다면 큰 지역에 특이한 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조화의 법칙이다.
또한 풍수에선 들판에 솟은 독산(獨山)은 묘나 집터로 쓰지 않는다. 이런 곳은 물이 생성하는 음기는 없고 산의 양기만 충천한다. 길기(吉氣)는 기대난이다. 독산이라도 자체 내에 골짜기와 언덕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발복(發福)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천지의 큰 기운이 작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복과 적선(積善)의 관계도 음과 양의 조화라 해도 될 것 같지 않은가. 인간의 욕심으로 발복만을 추구한다면 음양의 조화를 깨 파멸을 재촉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도 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어느 한편 ‘얻음’ 의 양이 있다면, 어느 구석엔 반드시 ‘잃음’ 의 음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시멘트로 뒤덮인 도시엔 땅이 숨쉴만한 공간이 없다. 질식사의 위기에 처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야외로 나간다. 땅을 밟고픈 욕망, 그 바람은 모자란 자연의 기를 흡수키 위한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출처 : 風따라 水따라 - blog.naver.com/chonjjj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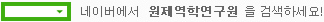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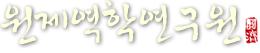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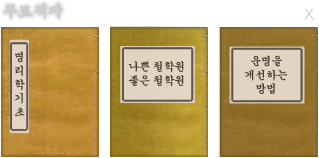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