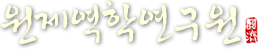양택의 개요 및 원리
권력을 향한 집념 - 명당 찾기
천지인 2017-09-29 17:40:59
조회수 : 1,208
‘왕기 서린 명당으로 이장’ ‘대선 경쟁은 묏자리부터’ ‘대선과 명당’….
이 말들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제목들이 아니다. 해묵은 스크랩북 속 4, 5년마다 되풀이되어온 신문과 잡지의 굵직한 활자들이다. 우리 일상에 밴 어쩌면 친숙한 느낌마저 들만한 글자들이기도 하다.
또한 흥선대원군, 윤보선, 김대중에서부터, 최근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까지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단어이기도 하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명당얘기로 시작한다.
이번에도 결코 비켜갈 수 없는 모양이다. 인물분석에 생가, 선영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친절하게도 이번엔 사주풀이까지 곁들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명당은 권력다툼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조선시대 효종왕릉은 남인과 서인의 당파 논쟁에 휘말린 대표적인 예가 된다. 천장(遷葬)으로 인해 초장(初葬)에 관련된 이들이 줄줄이 대역죄인으로 몰려 몰락했단 얘기다.
이렇게 보면 명당은 더 이상 보편적인 말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걸린 무서운 단어로 변한다.
‘왕후지지(王侯之地)’란 말이 있다. 왕이나 제후가 태어날만한 명당이란 말이다.
이런 땅을 찾아 헤맨 이가 흥선대원군이다. ‘천자 2명을 낸다’하는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의 묘. 절에 불까지 지르고 거금을 들여 매입한 땅에다 부친을 모셔 아들과 손자, 2명의 황제를 냈다. 예언이 실제로 나타난 예다. 적어도 풍수적 관점으론 맞아떨어지는 예다.
이장으로 말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묘도 빠질 수가 없다. ‘풍수의 신화’로까지 회자되는 판이나 더 말해 무엇하리.
스크랩엔 이런 얘기도 보인다. 16대 대선 무렵 이회창 당시 총재의 선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지엔 전국의 지관(地官)들이 모여들었단다. 모두들 연줄을 대며 자기가 주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판이라 교통정리마저 해야 했다한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관심사였던 건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 묘는 1년여만에 딴 곳으로 이장했다해서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만년 2인자’였던 JP, 이인제 전 지사의 부친묘 이장도 눈길을 끌었다. 95대선 무렵의 한화갑 전 대표나 김덕룡 전 의원의 이장 작업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권력에의 욕심이었던, 좀 더 나은 곳으로 모실려는 효심의 발로였던, 세인의 주목을 받던 저명인사들이었기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암장(暗葬)으로 권력을 잡은 이도 있다.
이순신 장군의 사패지지(賜牌之地)에 부친을 암장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4대조의 얘기는 풍수서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얘기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묻혀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인근에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고려말 최영 장군이 터를 잡고, 조선초 명재상 맹사성 선생이 살았던 ‘맹씨행단’이 있어 풍수호사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친묘는 합천의 속칭 ‘못재’라는 곳에 있다. 생가의 주산이기도 하다. 이 곳은 전 전 대통령과 파(派)가 다른 조상묘가 있는 곳인데, 그의 삼촌되는 이가 부친묘를 암장했다 한다. 손자 대에 대통령이 나왔으니 명당의 소응이란 얘기가 실감되는 부분이다.
좋은 땅은 찾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풍수의 본질이다.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어야 가능하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기는 물론이요, 패가에 나아가면 나라 기운마저 흔들리게 한다. 위정자들은 공인이다.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출처 : 風따라 水따라 - blog.naver.com/chonjjja
양택의 개요 및 원리
-
안흔한 택배기사님의 운전센스.jpgif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시리아 일본인 인질의 한국인 주장의 진실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180905 레드벨벳 [예리] 카메라 리허설 @2018 DMC 페스티벌 by 팔도조선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이순철과 이승엽의 쓴소리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황희찬 일본전 반칙에 대한 최용수의 일침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약후] 중부 지방 집중 호우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스트리머 방송사고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2018 WEC 르망 24시 내구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현실 방탈출 카페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지붕뚫고 하이킥 레전드 .jpg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공격적인 낸시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화성에서 '물' 발견, 남극 지하에 거대 호수
 채태균
채태균
-
2018년 8월, 놓칠 수 없는 주요 만화 소식 모음.jpg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등장 못하고 허우적 허우적 EXID 혜린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오빠마중 나온 동생.gif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