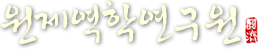양택의 개요 및 원리
천년동안 향불이 꺼지지 않는 땅
천지인 2017-09-29 18:14:12
조회수 : 1,187
이맘때 휴일이면 온 산하가 들썩인다.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 소름마저 끼칠 정도다. 벌초(伐草)의 계절이다. 그래도 살갗을 파고드는 나무뿌리, 봉두난발된 머리카락을 손질해줄 후손이 있는 묘라면 얼마나 다행인가.
필자의 증조부 묘는 일제시대 때 조성된 공동묘지에 있다. 평지가 아닌 산의 8부 능선쯤이다. 그래서 그런지 ‘묵은 묘(돌보는 이 없어 버려진 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며칠 전에도 두 기(基)가 새로이 동참을 했다는 걸 느꼈다. 추석까지 며칠은 남았으니 할 말은 없다만 아마도 내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작년에도 봉두난발이었으니 말이다.
인간은 자연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호화분묘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냥 묻혔다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다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묘들의 손자가 인근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다.
풍수에선 좋은 땅의 무덤이 오래간다고 본다. 후손들이 돈이 많던지, 번성하던지 간에 묘를 찾는 후손들이 끊이지 않는 다는 얘기다. 그와 반대로 나쁜 땅에 묻힌 이의 후손들은 함흥차사가 된다. 절손(絶孫)이 됐을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 돌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옛 책에 부장지(不葬地)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장사지낼 땅이 아닌 곳이다. 넓게 보면 집지을 곳이 아닌 땅이란 얘기도 된다. 절손이나 파재(破材)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경고성 이론이다. 몇 예만 들어보자. 우선 독산(獨山)에 터 잡지 말란 얘기가 있다. 홀로 들판에 뚝 떨어진 산이다. 애초부터 맥이 없다. 화산(火山)도 피해야 한다. 바위, 그것도 뾰족뾰족한 바위가 많은 산이다. 바위산은 탈살(脫殺)이 덜 된 땅, 죽은 땅이다. 메말라서 생기가 없다. 끊어진 산도 피해야 한다. 산사태 등으로 무너진 곳, 인위적으로 끊은 곳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이 새로 난 도로가 마을 뒤로 지나가는 곳이다.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을 때 근처 바위를 건드려선 안된다. 그 땅을 지키는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확률이 많다. 아무리 추한 돌이라도 말이다. 예컨대 뒤쪽에 있다면 맥이 들어오는 입수장소요, 앞에 있다면 기(氣)가 새나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자손천년향화지지(無子孫千年香火之地)’란 말이 있다. 돌보는 자손이 없어도 천년동안 제향(祭香)이 끊이지 않는 묘를 뜻한다. 부모 묘조차 내팽개치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진묵대사 모친 묘가 있다. 스님이니 후손이 있을 리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자손이 된다. 16세기에 조성된 묘이지만 이맘때면 학부모들로 한창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수능(修能) 기원장소다. 춘천의 우두산엔 소슬묘가 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조부 묘라느니, 일본 왕자의 무덤이라느니 전설이 깃든 곳이다. 이곳도 대표적 천년향화지지다. 병든 사람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 소원을 빌면 들어 준다한다. 그렇기 때문일까. 지금도 봉분엔 타다 남은 향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 두 곳은 명당 답산 코스에 반드시 끼는 곳들이다.
건물도 명당에 있으면 오래 간다. 전국의 명문고택을 보라. 모두가 명당이론에 합당한 장소에 들어섰다. 어찌됐건 좋은 땅에 집을 짓고 묘를 쓰고 볼일 이다.
출처 : - 風따라 水따라 - blog.naver.com/chonjjja
양택의 개요 및 원리
-
안흔한 택배기사님의 운전센스.jpgif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시리아 일본인 인질의 한국인 주장의 진실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180905 레드벨벳 [예리] 카메라 리허설 @2018 DMC 페스티벌 by 팔도조선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이순철과 이승엽의 쓴소리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황희찬 일본전 반칙에 대한 최용수의 일침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약후] 중부 지방 집중 호우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스트리머 방송사고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2018 WEC 르망 24시 내구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현실 방탈출 카페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지붕뚫고 하이킥 레전드 .jpg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공격적인 낸시
 임상븅호하
임상븅호하
-
화성에서 '물' 발견, 남극 지하에 거대 호수
 채태균
채태균
-
2018년 8월, 놓칠 수 없는 주요 만화 소식 모음.jpg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등장 못하고 허우적 허우적 EXID 혜린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
-
오빠마중 나온 동생.gif
 영수황수황ll
영수황수황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