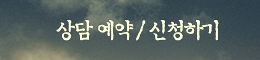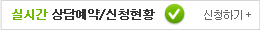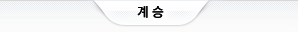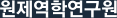안(案)
페이지 정보
본문
안(案)
명당의 안(案)은 지가서(地家書)에 보면 그저 높아야 눈썹 낮아야 가슴정도에 와 보여야 한다고 한다
이걸 제미제심(齊尾齊心)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음택(陰宅)에 대한 안(案)이고 양택(陽宅)의 안은 뒷 혈(穴) 입수(入首) 목(目)이 낮으며 앞 쳐다보는 안산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노적봉이나 병풍처럼 말이다 이래 천주고이팽조(天柱高而彭祖)라 건오(乾午)산(山)을 안(案)을 삼아선 논 명당이라면 그렇게 주인이 장수(長壽) 천복(天福)을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시골 살든 나의 집은 정남방 자좌오향 집인데 안(案)이 가까워선 높으기가 상당히 높으게만 보이는데 노적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풍도 아니고 그저 누에가 머리를 약간높이 들은 그런 아미 잠두사(蠶頭砂)로 생긴 안(案)이다 안(案)이 잠두(蠶頭)이면 그렇게 육축(六畜)이 번성(蕃盛)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역상(易象)으로 그렇게 상(床)에 음식 밥을 고봉으로 담아 논 것으로 비유(譬喩) 슬기롭고 지헤롭게 처세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그런 뽕잎을 누에가 밥으로 먹듯 그렇게 잘 앞에 음식 닥친 것을 먹어선 해결하는 모습 이것을 그렇게 떼배를 타고선 물결을 순항(順航)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인데
수천수괘(水天需卦)삼효(三爻) 스스로 도적의 몸을 지어선 그렇게 먹을 거리 음식을 먹어 나아가는 모습 시접(匙 ) 노 수저로 그렇게 국이라면 떠 먹는 것이 마치 노를 젓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물결을 사공(沙工)장정(長亭)이 노를 저어 헤쳐 나가는 그런 모습 형태라는 것이리라 그래 해석해선 성현(聖賢)이 말을 하길 일월(日月)이 기운을 다스리니 일흔두판 이더라 일은 두판 만에 유방이 항우를 이겨선 계명산하에 장자방 취적(吹笛)에 사면초가(四面楚歌)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 이 흐름을 보니 이십사위 방위가 모두 다 원만하게 돌아감이더라 그래 집에서 가축(家畜)을 기르니 늦게 가니 그렇게 육축(六畜)업(業)이 번성 하여선 우리 안에 그 가득하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다
그 집 앞에 커다란 검게 생긴 바위가 밭 가운데 누워 있는데 이게 그렇게 돼지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한해께 백부의 운을 봤더니만 이런 운이라 그렇게 그 해 집안 운도 좋고 돼지를 길렀는데 겨울이 되었는데도 돼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나을 수가 없어선 참으로 육축(六畜)이 왕성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었다
그런데 백부(伯父)가 원래 그 집을 지었지만 처음서부터 사신 것이 아니고 혼자 청상(靑孀)이 되신 그 윗 백모(白茅)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길러준 백모님 이신데 그러니 제일 큰집 모가치 집으로 지은 것이라선 그렇게 큰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었다 그렇게 큰 어머님이 사시든 집인데 시골서 그래 유지될 정도 재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골짜기에서 밥술을 먹는 형태로 생활을 지내오게 되었는데 집이 기억자 집에 행랑채를 또 니은자로 같다가선 붙친 그런 집을 지어선 안마당이 직사각형 구형(口形)으로 되어진 그런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 방이 많은지라 초등학교 부임해 오는 교사들이 어디 유숙할 곳이 마땅 찮아선 그렇게 집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되어선 있게 되어선 그렇게 하숙집이 되다시피 하여선 남의 사람 밥을 하여주게 되었는데 교사가 많을 적에 네다섯이 되다 시피 하였고 그저 평소엔 고정 세사람 정도 한해께는 그렇게 큰 산에 산판이 벌어졌는데 인부가 많이 난대서 왔는데 그 사람내들 까지 다 밥을 해주다 시피 해야 할판 그렇게 사람들이 벅적 거렸다
지금 이래 정작 얘기할 말은 안쓰고 이렇게 변죽이 심한 것이다 근데 잠두(蠶頭)하는 누에는 그래 꺼리는 것이 많은데 담배도 하고는 아주 상극(相克)이다 또 옷나무 하고 상극(相克)이고 근데 우연에 일치인진 몰라도 그 육축이 번성하듯 누에 벌레 이런 생김 애벌레들이 성하면 그렇게 성한 나무들이 없이 잎사귀를 갉아 먹는 것인지라 그래 산천이 되려 송충이 갉아먹듯 이렇게도 해운년 도수가 나쁘게 흐름 그런 식이 된다는 것이라 그래선 그런 것을 좀 예방하겠다고 그래서인지 이건 긍정(肯定) 생각이고 부정사관(否定思觀)으론 그래 뭔가 원척이 지고 배가 아퍼 서인지 [지금에 와선 생각함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건너다 보이는 우리 친구 집이 그래 음달에 있는데 거기 교사들이 유숙을 하였는데 한해께 교사들이 부임을 해오면서 그렇게 유숙하는 집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게 고만 양달에 사는 우리 집인 것이었다 이것을 이웃 간에 그렇게 따온 것이 되는 그런 처지가 생긴 것이다 그래 그렇게 이우간에 트러불이 지겠금 세태(世態)가 돌아가는 것이다 아마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그래 학교 가선 섭외를 너었다 든가 그래선 우리집 으로 와선 유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 아마 그렇다지.. 한해깨 친구 어머니가 서운한 조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내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 ]
그래 우연에 일치 신(神)들의 농간인지 그렇게 안산(案山)경사진 곳 거기가 모두 그렇게 층계진 밭들이 많은데 그렇게 밭둑가에 그 건너 사는 우리 친구 벗 아버님인지 할아범님인지 언제적 갔다가 심은 옷나무가 있어선 그렇게 옷나무가 한해보니 굵어 지기가 큰 석가래 작은 기둥 정도로 굵어진 모습 그래 해마다 그렇게 옷순을 꺾어선 먹는 것인데 그 가에로 그래 사방 움이 솟아선 뻗어나가는 모습 옷 나무는 누에하고 아주 상극인 것이다 그래선 잠두봉 있는데는 뽕나무를 심어야지 옷나무 심으면 고만 그냥 망가진다는 것이지.. 경상도 어느땅 그렇게 잠두봉 아래 토호(土豪)세력이 부귀함을 누리고 권세가 이만저만 아니게 거들먹 거리는데 그렇게 육축(六畜)이 번성하고 하는 모습 근데 국가에 그렇게 세금도 제대로 안 받치고 유지(遺志) 토호세력화 하니 나라에서 그래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 현감이 산세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 지라
그래선 고약한 토호세력이라 하고선 그렇게 뽕나무 가득 들어선 것을 그 뭐 자연산 이었는가 보다 그 국가가 무슨 행사할 일이 있다 하고선 베어버리고 그래 거기 길을 내고 물도랑을 파고 그래 옷나물 갔다가선 심어 재키니 고만 수년안으로 그 토호가 망가지더라는 것이더라 그렇게 인제 밉상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명당도 그렇게 형질이 변형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적악을 하면 그런 식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뭐 우리 어른이 그렇다면 적악을 했다는 말인데 그럴리 없고.. 그렇게 우연 일치로 그렇게 되어 돌아갔다 이런 말인 것인데
그런데 하도 해마다 옷 순을 꺽어 질러 먹고 그렇게 지금은 그게 덜하지만 한창 경제개발 될 적에 그래 굶다가 좀 살기가 나아져선 입에 먹거리가 세어 졌는지라 그래 고만 세어진 모습 툭 하면 닭도리탕을 해먹는데 그래 거기 웃닭이 좋다고 하니 고만 그 옷나무를 야곰 거리고 껍데기를 벳겨 다먹어 재키니 아무리 좋든 옷나무인들 베겨 날수가 없는 것인지라 그래 고만 우연에 일치로 옷나무가 망가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백모님 큰 아들 사는 서울로 오시고 우리 백부가 와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육축(六畜)이 번성하는 해를 만나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하지만 개중에도 잘 되는 자손 있어선 지금 와선 그렇게 거물(巨物)이 되다 시피 하였는데 해마다 명절때는 이 못 난사람이 손위 사람이라고 그래 뭘 그래 보내오는데 고맙기도 하지만 안 보내도 고만 인데 뭘 그래 보내는가 내가 답을 못하니 그래 하는 말이리라
근데 기곡(基谷)마을 집 생긴 집터가 그래 우리 집 하고 그 아래 먼 우회로 사돈 간이 된 집이 나중 되었는데 민씨네 집 하고 이래 두어 채가 그냥 저냥 길지(吉地) 그저 밥이나 먹는 명당이 되는데 예전엔 그렇게 길삼하고 잠(蠶)을 많이 쳤다 그래 봄잠을 쳐선 공출(供出)하고 그 쌍고치나 이런 짜투리 남는 고치를 그래 남겨선 그 명주실을 내게 되는데 그래 허드렛간에 화독을 만들어선 거기다간 임시로 그렇게 작은 솥 같은 것을 언지고선 고치를 실 내려고 삼는다 그러면 그렇게 젓갈 같은 것으로 휘어 저으면 그래 가느다란 실끝의 머리가 묻어져선 나온다 이것 그렇게 인제 물레 에다간 송곳을 설치하고선 자아선 감아 돌리는데 그렇게 고치가 솔솔 거리며 돌아가면서 잘 풀릴수가 없다
그래 다 풀리면 고만 그 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맛 있을수가 없거든 ... 그래 그 어릴적 민씨 할아버지 자부(子婦)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 얻어 먹기도 하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 디딜 방앗간이 그렇게 집 옆에 붙어선 있었는데 반 헛간 식으로 그 윗집 아마 디딜 방앗간 그 형제 인데 그래 그 민씨 할아버지 동생쯤 되는 그런 집의 헛간 인데 할머니가 시시는데 할머니 노파 인지라 손녀 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그런 집이었다 그 손녀 딸이 우리하고 동갑내기인데 아버지가 일찍이 그래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젊어 수절 할수 없다고 보낸 모양 그래 딸만 남겨두고 후살이 간 것 그 할머니 노파가 키우신다
그집 헛간 겸 그래 디딜 방앗간 있는데 거기 다간 의지간을 삼아선 그렇게 명주실을 뽑는 것을 차려 논 것이다
그 헛 공간 마당 같기도 하고 그래 하도 어릴 적 열 살 안쪽 일 이야기니 아주 고만 예전 이야기라 그래 울안 뒤쪽으로 바위들이 있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가 그렇게 우리들 놀이터가 있었다 그래 신발을 벗어선 접어선 그렇게 차 놀이를 하고 하든 그런 곳인데 거기 그렇게 감나무들이 몇그루 서있고 그 아래 윗집 경계된 약간 돈덕진데 그렇게 고염 나무가 알암드리가 되다시피 있는데 그렇게 고염이 많이 달릴수가 없어선 그 명주실 내든 여름 날 시절 그렇게 고염 꽃이 많이 필수가 없어... 아주 잔뜩 나무 숲진데 달리어선 피는 것이 었다
그러면 그래 토종 벌들이 그렇게 꿀을 따느라고 웅성거리고 왕왕 거리고 다닐수가 없다
그런데 그 민씨네 집이 좌향이 아마 계좌정향쯤 아니 조금 더 축(丑)쪽으로 돌았든가 하는데 그 집 뒷산이 그래 그 골짜기 집들어선 데 비하면 상당히 높아선 그 둔덕 산 언덕에 올르려면 한참 올라가야 하는 그런 아주 급 경사진 곳이다 그 흙이 모두 그래 찰흙 진흙이 되어선 비만 조금 오면 상당히 길이 경사진 곳이 미끄럽다 그런데 안산(案山)은 그 보다 몇 곱절은 더 높아선 참말로 노적봉 안(案)인데 아주 근접 하여선 있는 모습 천주고이팽조(天柱高而彭祖)라 하여선 그런진 몰라도 상당히 높은 산으로 되어진 모습이다
그래 그 대주 되는 분이 그렇게 천수(天壽)를 누리고 사시었는데 두 양주분이 오래 사시었는데 할머니 늦게 가선 귀를 잡수시는 바람에 고만 마당에 차가 와선 그렇게 뒷바꿈질을 하는 것을 소리 못듣고 계시단 들이 받는 바람에 첩촉사고로 고만 돌아가시었다고 나중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 그러고선 그 할버지 그렇게 거의 백수에 근접하시다간 아마 몇해 전에 돌아 가시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할말은 아주 작아선 변죽은 이렇게 심하지만 아주 간단한다 금일 아침 몽사에 그렇게 거기 뒷 동산 언덕진데 여름날인가 보다 뭣하러 올라 갔는지 그래 올라 갔는데 그렇게 그 민씨네 집 뒤로 그렇게 내려오게 된 모습 그런데 경사가 그렇게 급경사 아무래도 칠팔십도 이래 경사진 곳처럼 느껴 지는데 가만히 고만 서서만 있어도 그렇게 줄줄 줄줄 그 높이도 보이고 하면서 그 아래 고만 한참 그렇게 무저정천(无底井泉)내리듯 미끄러 져 내려가는 것인데 그래 푸른 숲이 그래 막 머리위로 지나가는 모습인 것 그런 모습으로 거의 그렇게 명주실 내든 자리 거기 거의 와선 잠이 깨다 ...
그래 인생이 이제 다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도록 허물 벗김 생활고에 옥죄이고 있는 모습 아마도 봉래산 신선을 만나러 가는 날이 근접한가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
출처 : 안(案) - cafe.daum.net/dur6fk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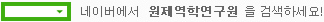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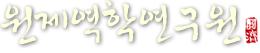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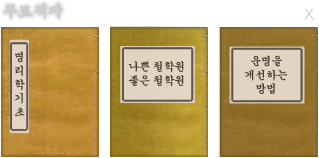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